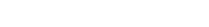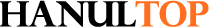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접속
작성자: 나영빛차
등록일: 25-09-18 14:25
후석 천관우 선생. 이부영 위원장 제공
60년대 말까지 40대 중반 이전에 동아 등 주요 신문사 간부 섭렵 71년 최초 민주화운동 상설단체인 ‘민수협’ 만들어 모든 성명서 집필 3년 뒤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도 박정희 정권에 ‘펜’ 빼앗긴 뒤에는 한국사 연구와 집필에 몰두
언론계 후배들 지난 11일 추모식
지난 8월10일 후석 천관우(1925~1991) 선생 탄생 100년을 맞아 한국언론회관 19층 매화홀에서 11일 추모식과 강연회를 가졌다. 문화방송 사장과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중배 선배를 초청인으로 모시고 동아-조선투위 해직언론인을 비롯한 많은 후배 언론인이 모여 한 시대 언론계의 큰 별 천관우 선생을 대림통상 주식
기리고 언론인, 역사학자,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행적을 되돌아봤다. 이 모임은 1975년 동아일보 대량해직 사태 이후 동아일보 내외로 갈렸던 지난날의 선후배 동료들이 함께 존경했던 ‘천관우 선배’를 추모하며 재회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고인을 기억하는 현역 언론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1950~60년대 말까지 40대 중반 이전에 동아, 조선,RP상품
한국, 민국일보 등 한국의 주요 언론사 논설위원, 편집국장, 주필을 섭렵한 천 선생은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에 정론으로 맞선 한국의 대표언론인이었다. 삼선개헌과 유신을 준비하고 있던 박정희 정권에게 1968년 ‘신동아’ 12월호에 실린 ‘차관’ 특집을 통해 대규모 정치자금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정보부의 대규모 탄압에 동아일보사는 굴복해 천관우 성창기업지주 주식
주필을 해임했다. 이 해임 사태가 국내외에서 언론탄압으로 비난당하게 되자 한해 뒤 복직되었지만, 주필을 지낸 천 선생이 집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동아일보 역사를 정리하는 일을 맡겼다. 모욕이었다. 천 선생은 동아일보사 이사 자격으로 최초의 재야 민주화운동 상설단체인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수협, 71년 4월 결성)에 함석헌 선생, 김재준 목사, 이병린 변호사바다이야기 꽁머니
와 함께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천 선생은 이 단체의 거의 모든 성명서와 주요문건을 집필했다. 이부영을 비롯한 기자 몇이 주요 인사들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서명받아오는 일을 도왔다.
1975년 3월17일 새벽 고인(왼쪽 두번째)이 정일형·이태영 선생 부부와 함께 동아일보사 앞에GREATGREEN 주식
서 자유 언론을 지키려는 기자들을 축출하려는 동아일보 사주와 독재정권의 폭거를 규탄하고 있다. 이부영 위원장 제공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박정희 정권은 눈엣가시로 여기던 천 선생을 동아일보사로부터 영구히 추방했다. 천 선생은 투쟁을 한 단계 높였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보다는 회복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1974년 12월25일 윤형중 원로신부(상임대표), 함석헌 선생, 이병린 변호사, 강원용 목사 등 재야인사 71명과 함께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 유신독재 반대운동의 한가운데에 섰다. 동아일보사 기자들의 10·24 자유언론 실천선언도 천 선생 언론계 추방이라는 폭거를 포함, 백지광고 사태 등 언론탄압에 저항한 ‘사건’이었다. 1975년 3월17일 새벽 동아일보에서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 자유언론실천에 앞장선 후배 언론인 160여명이 축출되어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천 선생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이놈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외치고 계셨다. 3층 편집국 창문으로 그런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던 우리 기자들도 “자유언론 만세”를 외쳤다.
아직 쉰도 안 된 나이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언론사 고위직에 오래 있었던 천 선생이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도 없었다. 신문 잡지에 기고할 길도 모두 막혔다. 그 많던 언론계 후배들도, 많은 손님도 천 선생 댁에는 발길이 끊겼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 자루 촛불을 밝히고(일주명창 一炷明窓) 실학 등 한국사 연구와 집필에 전념하는 길뿐이었다. 그리고 가난과 고독의 심연은 더욱 깊어졌다.
2025년 8월11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고 천관우 선생 탄생 100년 추모식과 강연회에 많은 후배 언론인과 친지들이 참석했다. 이부영 위원장 제공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이 8월11일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후석의 ‘복합국가론\'이 한국의 ‘국가연합\' 정책의 첫번째 공개제안이었다고 밝혔다. 이부영 위원장 제공
박정희 유신독재의 폭정이 길어질수록 민주화운동 진영의 이념적 경직성도 따라서 굳어졌다.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전두환 군부집단의 탄압과 왜곡이 자행되었을 때, 천 선생의 시대인식은 자신의 위상보다는 우측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천 선생도 광복 직후의 이념적 트라우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동아-조선투위 후배 언론인들마저 멀어졌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천관우 선생 탄생 100년 모임에 앞서 동아-조선투위 후배들은 천 선생 묘소를 찾아 깊이 머리 숙여 참배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1. 후석 천관우 선생의 실학·역사연구(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2. 후석 천관우 선생의 통일사상 ‘복합국가론’(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3. 우리 시대의 언관사관(言官史官), 후석 천관우 선생(장성원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4. 후석 천관우 선생과 최초의 재야운동 ‘민주수호국민협의회’(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가 발표되었다.
50년대와 60년대 한국언론의 두 별은 누가 뭐래도 동아일보 주필 천관우 선생과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 선생이라고 꼽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부영/동아투위 위원장
60년대 말까지 40대 중반 이전에 동아 등 주요 신문사 간부 섭렵 71년 최초 민주화운동 상설단체인 ‘민수협’ 만들어 모든 성명서 집필 3년 뒤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도 박정희 정권에 ‘펜’ 빼앗긴 뒤에는 한국사 연구와 집필에 몰두
언론계 후배들 지난 11일 추모식
지난 8월10일 후석 천관우(1925~1991) 선생 탄생 100년을 맞아 한국언론회관 19층 매화홀에서 11일 추모식과 강연회를 가졌다. 문화방송 사장과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중배 선배를 초청인으로 모시고 동아-조선투위 해직언론인을 비롯한 많은 후배 언론인이 모여 한 시대 언론계의 큰 별 천관우 선생을 대림통상 주식
기리고 언론인, 역사학자,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행적을 되돌아봤다. 이 모임은 1975년 동아일보 대량해직 사태 이후 동아일보 내외로 갈렸던 지난날의 선후배 동료들이 함께 존경했던 ‘천관우 선배’를 추모하며 재회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고인을 기억하는 현역 언론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1950~60년대 말까지 40대 중반 이전에 동아, 조선,RP상품
한국, 민국일보 등 한국의 주요 언론사 논설위원, 편집국장, 주필을 섭렵한 천 선생은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에 정론으로 맞선 한국의 대표언론인이었다. 삼선개헌과 유신을 준비하고 있던 박정희 정권에게 1968년 ‘신동아’ 12월호에 실린 ‘차관’ 특집을 통해 대규모 정치자금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정보부의 대규모 탄압에 동아일보사는 굴복해 천관우 성창기업지주 주식
주필을 해임했다. 이 해임 사태가 국내외에서 언론탄압으로 비난당하게 되자 한해 뒤 복직되었지만, 주필을 지낸 천 선생이 집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동아일보 역사를 정리하는 일을 맡겼다. 모욕이었다. 천 선생은 동아일보사 이사 자격으로 최초의 재야 민주화운동 상설단체인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수협, 71년 4월 결성)에 함석헌 선생, 김재준 목사, 이병린 변호사바다이야기 꽁머니
와 함께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천 선생은 이 단체의 거의 모든 성명서와 주요문건을 집필했다. 이부영을 비롯한 기자 몇이 주요 인사들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서명받아오는 일을 도왔다.
1975년 3월17일 새벽 고인(왼쪽 두번째)이 정일형·이태영 선생 부부와 함께 동아일보사 앞에GREATGREEN 주식
서 자유 언론을 지키려는 기자들을 축출하려는 동아일보 사주와 독재정권의 폭거를 규탄하고 있다. 이부영 위원장 제공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박정희 정권은 눈엣가시로 여기던 천 선생을 동아일보사로부터 영구히 추방했다. 천 선생은 투쟁을 한 단계 높였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보다는 회복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1974년 12월25일 윤형중 원로신부(상임대표), 함석헌 선생, 이병린 변호사, 강원용 목사 등 재야인사 71명과 함께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 유신독재 반대운동의 한가운데에 섰다. 동아일보사 기자들의 10·24 자유언론 실천선언도 천 선생 언론계 추방이라는 폭거를 포함, 백지광고 사태 등 언론탄압에 저항한 ‘사건’이었다. 1975년 3월17일 새벽 동아일보에서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 자유언론실천에 앞장선 후배 언론인 160여명이 축출되어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천 선생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이놈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외치고 계셨다. 3층 편집국 창문으로 그런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던 우리 기자들도 “자유언론 만세”를 외쳤다.
아직 쉰도 안 된 나이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언론사 고위직에 오래 있었던 천 선생이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도 없었다. 신문 잡지에 기고할 길도 모두 막혔다. 그 많던 언론계 후배들도, 많은 손님도 천 선생 댁에는 발길이 끊겼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 자루 촛불을 밝히고(일주명창 一炷明窓) 실학 등 한국사 연구와 집필에 전념하는 길뿐이었다. 그리고 가난과 고독의 심연은 더욱 깊어졌다.
2025년 8월11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고 천관우 선생 탄생 100년 추모식과 강연회에 많은 후배 언론인과 친지들이 참석했다. 이부영 위원장 제공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이 8월11일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후석의 ‘복합국가론\'이 한국의 ‘국가연합\' 정책의 첫번째 공개제안이었다고 밝혔다. 이부영 위원장 제공
박정희 유신독재의 폭정이 길어질수록 민주화운동 진영의 이념적 경직성도 따라서 굳어졌다.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전두환 군부집단의 탄압과 왜곡이 자행되었을 때, 천 선생의 시대인식은 자신의 위상보다는 우측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천 선생도 광복 직후의 이념적 트라우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동아-조선투위 후배 언론인들마저 멀어졌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천관우 선생 탄생 100년 모임에 앞서 동아-조선투위 후배들은 천 선생 묘소를 찾아 깊이 머리 숙여 참배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1. 후석 천관우 선생의 실학·역사연구(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2. 후석 천관우 선생의 통일사상 ‘복합국가론’(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3. 우리 시대의 언관사관(言官史官), 후석 천관우 선생(장성원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4. 후석 천관우 선생과 최초의 재야운동 ‘민주수호국민협의회’(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가 발표되었다.
50년대와 60년대 한국언론의 두 별은 누가 뭐래도 동아일보 주필 천관우 선생과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 선생이라고 꼽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부영/동아투위 위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